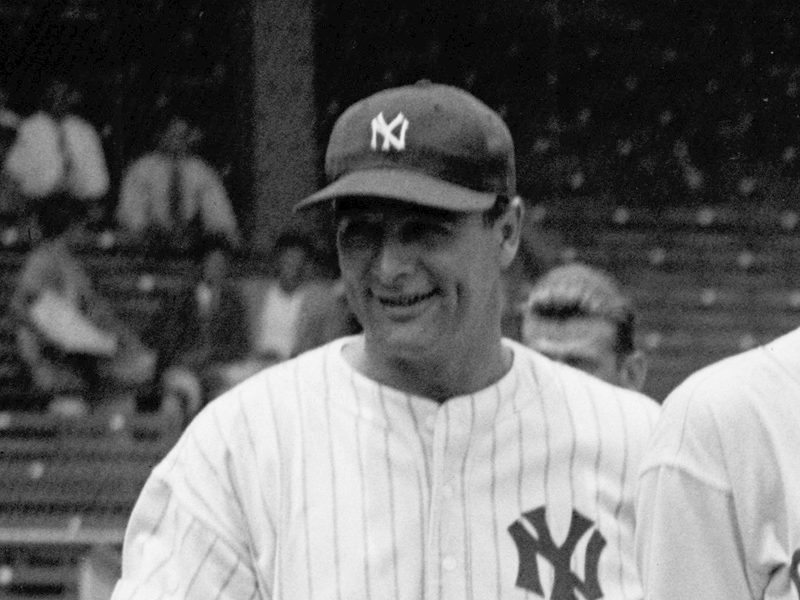배임죄 프레임 뒤에 숨은 본질은 ‘검찰의 무소불위 칼춤’이다. 기업과 정책 결정자의 목을 겨누던 배임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때다.
여야의 동상이몽, 배임죄 폐지 논란의 핵심
‘배임죄 폐지‘라는 화두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 규정하고 총공세를 편다.
대장동 사건의 족쇄를 끊으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족쇄 풀기’라는 명분으로 맞선다.
낡은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으니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유지와 폐지 쪽이 바뀐듯한 느낌이다.
진보 진영이 ‘기업 투자 위축’을 폐지 논거로 내세우고
보수 진영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유지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마치 창과 방패를 바꿔 든 듯한 이 기묘한 대치 구도야말로,
배임죄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본질을 잃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배임죄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 임무에 반한다.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즉,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주로 회사 임원, 공무원, 대리인, 관리인 등이 대상이다.
그 동안 기업총수들이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경우가 많았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검찰이 이 배임죄를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활용했다는 것이다.
법 적용이 상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틈을 파고든 것이다.
어차피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리니,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탈탈 털어보자는 심산이다.
실제로 배임죄는 검찰의 패소율이 높은 죄목 중 하나지만,
법원의 높은 무죄율은 검찰에게 그저 참고 사항일 뿐,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관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몇 개의 상징적인 사건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배임죄 사건이다.
배임죄 사례 1: 삼성 이재용, ‘경영 판단’이라는 방패
쟁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가.
검찰 주장: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회사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배임죄 성립.
법원 최종 판단: 배임죄 부분 무죄.
이유: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합병이 이뤄졌고,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

이 사건은 “배임죄 요건이 너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현재 진행형인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다.
배임죄 사례 2: 대장동, 끝나지 않는 ‘배임의 뫼비우스 띠’
관련자: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등.
쟁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도록 설계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가.
검찰 주장: 적정 이윤을 환수하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
피고인 측 주장: 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뿐, 형사 책임은 부당.

1심과 2심에서 배임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는 사건이다.
위의 두 사건만 보아도 검찰이 기획 및 표적 수사 시
피의자를 가장 손쉽게 엮을 수 있는 죄목이 바로 배임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임죄라는 칼: 이제는 버려야 할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까지 ‘배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모든 정책 결정자와 기업가는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이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소극적 판단으로 이어질 뿐이다.
진짜 문제는 배임죄가 검찰의 손에 들린 ‘무소불위의 칼’이 되어,
기업인과 정책 결정자의 목을 겨눠왔다는 점이다.
물론 질 나쁜 경제인이나 부패한 공무원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배임’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몇 년씩 수렁에 빠뜨리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상법상 책임, 횡령죄 등으로도 제재 가능하다.
굳이 형법상 배임죄를 둘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