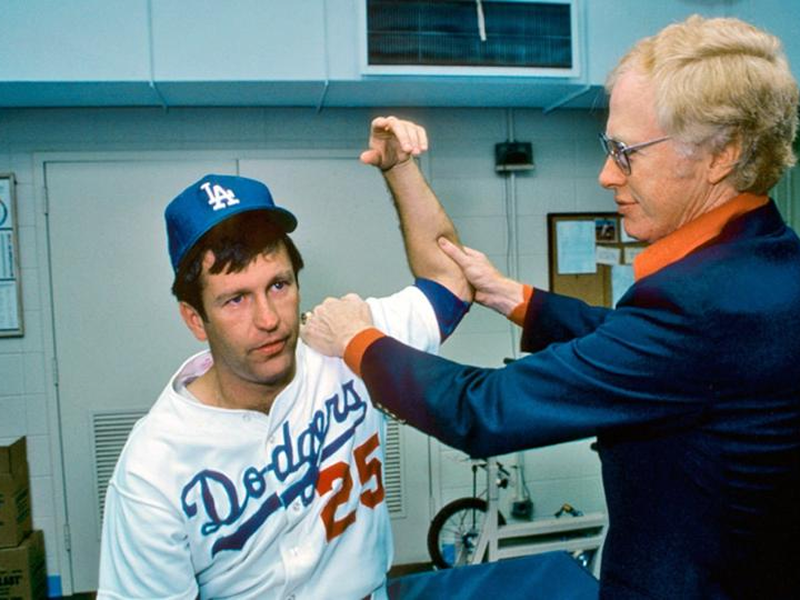끝없는 변명과 책임 회피 — 한덕수 재판이 보여준 공직자의 민낯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한 한덕수의 재판 태도
11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정.
그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계엄 반대 의사 표시 의도로 국무위원을 부르자고 했을 뿐,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자고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깊은 후회와 자책을 한다.”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이었지만,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그는 단 한 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을.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조차 증언했다.
“한덕수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계엄에 반대했다”, “막으려 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변명, 반성이 아닌 노골적인 자기방어다.
그의 언어는 철저히 책임을 피하려는 자기 보호막일 뿐이다.
진정한 사과 대신, 끝없는 핑계 한덕수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제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황망한 상황이었다”, “노력했다”, “의도는 반대였다”는 핑계의 조각들만 흘러나왔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한덕수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한다.
그의 태도는 공직자가 보여야 할 책임의 윤리와는 정반대다.
공직자 윤리가 실종된 자리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행정부의 2인자 한덕수가 저버린 헌법적 의무
재판부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모두를 검토 중이다.
그가 적극적 협조자였는지, 아니면 알고도 방조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부속기관이 아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닌 자리다.
한덕수는 그 의무를 저버렸다.
그는 침묵으로 권력을 방조했고, 침묵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의 죄는 단순히 사태를 ‘모른 척한 방조’를 넘어선다.
그것은 바로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조선의 신하보다 못한 오늘의 수 많은 한덕수
조선시대에도 왕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목숨을 건 신하들이 있었다.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간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충신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대통령의 명령이 법과 헌정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도 “아니오” 한마디 할 공직자가 없었다.
한덕수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오늘의 공직사회가 어디까지 타락했는가를 드러낸 역사적 거울이다.
한덕수에게는 없는 공직자의 양심이 사라진 자리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묻는 시험대다.
한덕수는 대통령에게 충성했을지 모르지만,
헌법과 국민에게는 명백한 배신자였다.
그의 끝없는 변명과 거짓은 한 시대의 윤리적 파산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공직자의 양심 회복이다.
– 아크로폴
한덕수 ‘거짓 증언’의 나비효과, 추경호 – ‘계엄 해제’ 표결 방해는 어디까지 사실인가? ‘정치탄압’의 값싼 코스프레: 추경호 발언의 부적절성 추경호 –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가 아닌 ‘불구속’에 따른 염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