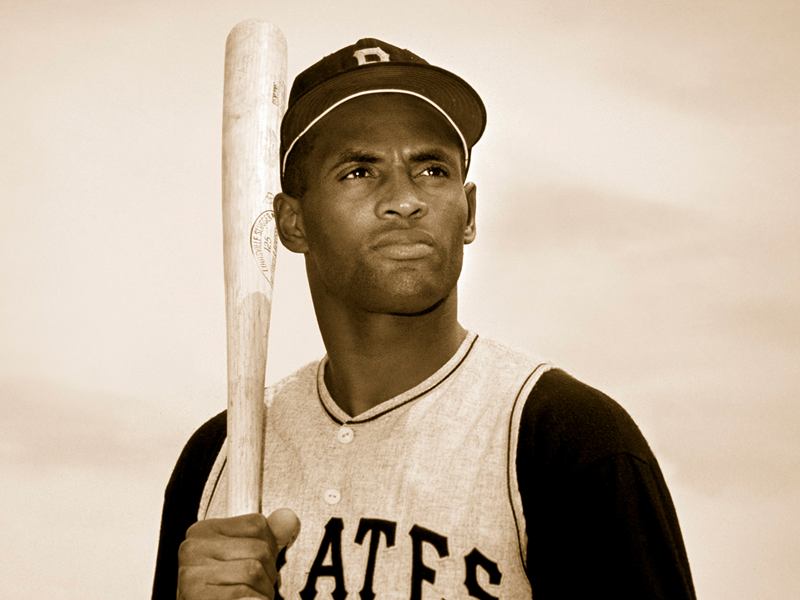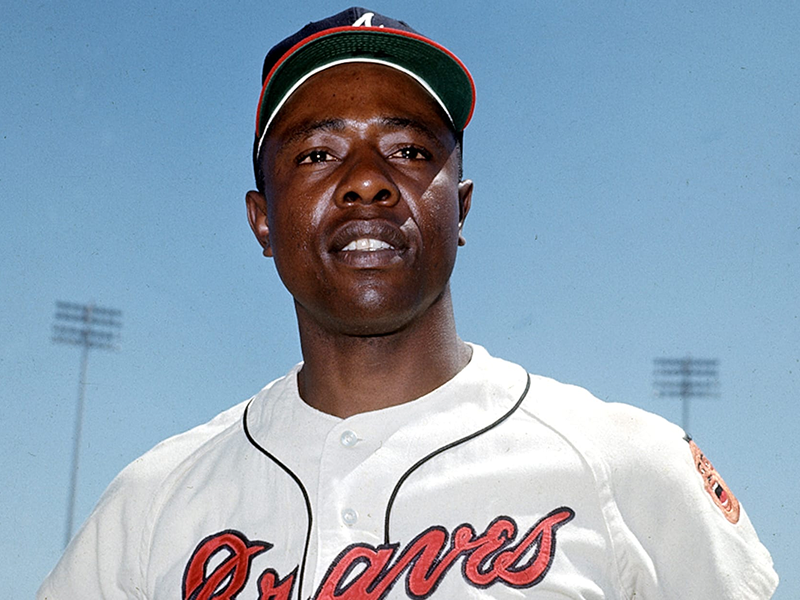다시 되살아난 눈먼돈 – 특활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72억900만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기 폐지한 정부 각 부처 특활비가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더 황당한 건 기재부 예비비. 2조4000억 원에서 무려 4조2000억 원으로 다시 증액했다.
이쯤 되면 의도가 분명해진다.
다시 한 번, 국민 세금을 정부의 ‘비공개 지갑’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특활비 – 영수증도 없고, 기록도 없는 ‘부패용 예산’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필요 없다.
어디에 썼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즉,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게 “국민 세금을 너희 마음대로 현금처럼 써라”라고 허락하는 예산이다.
감사도, 보고도 없다.
국민은 이 돈이 어떤 장부에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길이 없다.
이건 정부 예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회계 블랙홀이다.

특수활동? 웃기지마라 — 비리가 ‘특수활동’처럼 진행됐다
과거부터 특활비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 비판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비리 사건으로 수십 번 증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일.
청와대는 자체 특활비가 있음에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박근헤는 물론 핵심 참모들도 보너스처럼 나눠 가졌다.
특활비 유용으로 사법 처리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군사정권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명박 – 원세훈 특활비 유용 사건
이명박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를 빼돌려 강남 한복판 비밀 공간을 호화롭게 꾸미고, 나아가 스탠퍼드대 연구원 생활 준비 자금까지 마련했다.
정권 핵심부 상당수가 특활비 관련 혐의로 감옥에 갔다.
이유는 단 하나.
특활비가 곧 ‘정권의 ATM’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의 특활비 ‘돈봉투 잔치’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안태근 감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씩 돈봉투를 나눠준 사건도 있었다.
출처는 물론 특활비였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봉투를 후배에게 ‘격려금’이라며 돌렸다.
이 정도면 특활비는 공직자 전용 용돈이었고, 부패는 ‘관행’이었다.

감시 불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부패한다
특활비는 구조적으로 감시가 불가능하다.
-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록 없음
-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공개 의무 없음
- 영수증 제출 의무 없음
- 감사원조차 사용처 파악 불가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부패한다.
부패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예산이다.
정부가 특활비를 유지하려는 진짜 목적은 단 하나다.
스스로 마음대로 쓰고 싶기 때문이다.
안보? 기밀? 다 핑계다.
특활비 – 선진국은 폐지·축소 흐름, 한국만 거꾸로 가는 이유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영수증 제출은 필수이고, 용처는 비식별 형태로 공개한다.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간다.
특활비를 되살리고, 예비비를 급증시키고, 기록 없는 예산을 다시 확대한다.
이건 국가 운영이 아니라 정치적 사적 금고 관리다.
특활비는 국가 부패의 뿌리, 즉시 폐지해야 한다
특활비는 부패의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 아니다.
부패하도록 설계된 예산이다.
영수증도 없고, 기록도 없고, 감시도 없다.
이런 예산을 유지한다면 어떤 정부든 반드시 썩는다.
국가 운영은 국민 세금으로 한다.
국민 세금을 감추고, 뭉개고, 사적으로 쓰는 일이 계속된다면그 국가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특히 내년에 없어질 검찰청에 72억이나 되는 특활비를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청을 없애게 되어 미안해서 쫑파티 회식비를 많이 배정한 것인가?
당장 특활비를 폐지하라.
국민 세금을 권력자들의 비밀 금고가 아닌 국가 운영에만 쓰도록 하라.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들과 달라야 한다. 그 출발점이 특활비 폐지다.